여행
"지워야 할 건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 사람들]
- 김영현 빠삐용집 총괄기획단장 인터뷰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빠삐용집, 강력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 일궈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외곽. 한때 수용자만 드나들던 폐쇄된 공간이 다시 사람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장흥교도소가 '빠삐용집(Zip)'이라는 이름의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감옥의 철문과 감시탑은 그대로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공간의 설계자이자 총괄기획자인 김영현 단장은 감옥을 ‘지워야 할 장소’가 아닌 '되살려야 할 기억의 장소'로 바라봤다. 그는 폐쇄와 단절의 상징이었던 감옥을 회복과 사유의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김 단장은 말한다. “지워야 할 건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옥은 지워지는 공간이 아니다
김 단장이 장흥교도소를 처음 마주한 건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지역 자산을 조사하던 그는 이 공간에서 강한 직관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그는 “보통은 감옥을 철거하고 예쁜 문화공간으로 다시 짓는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불편한 장소지만, 동시에 강력한 기억의 공간”이라며 “지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단장은 감옥의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철문도, 감방도, 복도도 그대로 뒀다. 다만 그 안의 기능만 바꿨다. 접견실은 도서관이 되고, 감방은 글쓰기 체험 공간으로, 복도는 시 낭독회가 열리는 무대로 탈바꿈했다.
김 단장은 빠삐용집을 '관계의 플랫폼'이라고 정의한다. 외부 전문가나 기획자가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는다. 주민이 직접 해설사가 되고, 청년이 바리스타가 되며, 마을 이장이 투어 가이드를 맡는다.
김 단장은 “투어 중 마을 이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 감옥에서 누구 아버지가 근무했었고, 어릴 적 철문 너머가 늘 궁금했었다’고. 그게 곧 콘텐츠다. 주민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콘텐츠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이미 지역에 답이 있었다”며 “장소가 있고, 기억이 있고, 사람이 있다. 빠삐용집은 그걸 연결해주는 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감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상징은 명확하다. 단절과 격리다. 하지만 김 단장은 이 공간에서 오히려 ‘회복의 가능성’을 실험 중이다.
김 단장은 “지금의 도시는 오히려 감옥 같을 때가 많다”며 “단절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 빠삐용집은 거꾸로 그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관계 회복은 ‘주민 참여’를 뜻한다. 공간의 설계와 기획은 김 단장이 맡았지만, 프로그램과 운영은 장흥 주민들이 직접 주도한다. 이 구조는 감옥 외곽에 마련된 ‘서로살림터’로도 확장된다. 이곳은 자원순환, 생존기술, 생활교육 등을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학습공간이다.
그가 생각하는 자치에는 전문가가 없다. 김 단장은 “배우는 사람이 선생이 되고, 선생이 다시 배우가 된다. 전문가가 필요 없다”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보는 거죠. 그게 진짜 자치 아닐까”라고 되려 반문해 보였다.
실제로 빠삐용집은 수용동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고, 철문·감시탑·감방 등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도시락 체험, 출소 두부, 수용복 착용 등 감옥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남겼다. 다만 그 안의 콘텐츠는 모두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이 공간은 운영 방식에서도 기존 관광 모델과 다르다. 해설사, 큐레이터, 영상 기획자 등은 모두 지역 주민이다. 외부 대행 없이 주민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수익도 지역에 남긴다.
김 단장은 “다른 지역은 외부 콘텐츠를 들여오고, 운영도 대행사에 맡긴다. 그러면 지역은 소비만 한다”며 “하지만 장흥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수익도 직접 가져간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빠삐용집은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 촬영지로도 떠오르고 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더 글로리>, 영화 <1987> 등 90여 편의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김 단장은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살아 있다. 영상 산업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산업이 아니라, 체류하는 산업”이라며 “이건 단순 관광보다 훨씬 강력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촬영팀은 평균 70명 규모로 3~5일씩 장흥에 머문다. 숙박, 식사, 차량, 장비 대여 등 모든 수요가 지역에서 해결된다.
김 단장은 “빠삐용집은 관람지가 아니라 체험지이고 관계지”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빠삐용집은 ‘감옥호텔 프리즌’이라는 체류형 숙소도 준비 중이다. 기존 수용동 일부를 리모델링해 영화 제작팀은 물론 일반 여행자도 숙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객과 지역 청년이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그는 “숙박이 단지 머무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진짜 관광은 관계가 있어야 지속된다. 혼자 보고 끝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빠삐용집이 생기며 장흥을 다시 찾는 사람이 늘었다. 한때 잊힌 지역이 영상 산업과 문화 재생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문은 여전히 닫혀 있지만, 그 안은 활짝 열려 있다.
현재 빠삐용집은 유휴공간 재생의 대표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서에 포함됐고, 공무원 교육 자료와 타 지역 벤치마킹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 단장은 마지막으로 “이 감옥은 지워지지 않은 과거 위에 오늘을 덧입힌 공간이다. 그 안에서 사람은 머물고, 이야기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한다”며 “장흥의 내일은 바로 이 기억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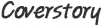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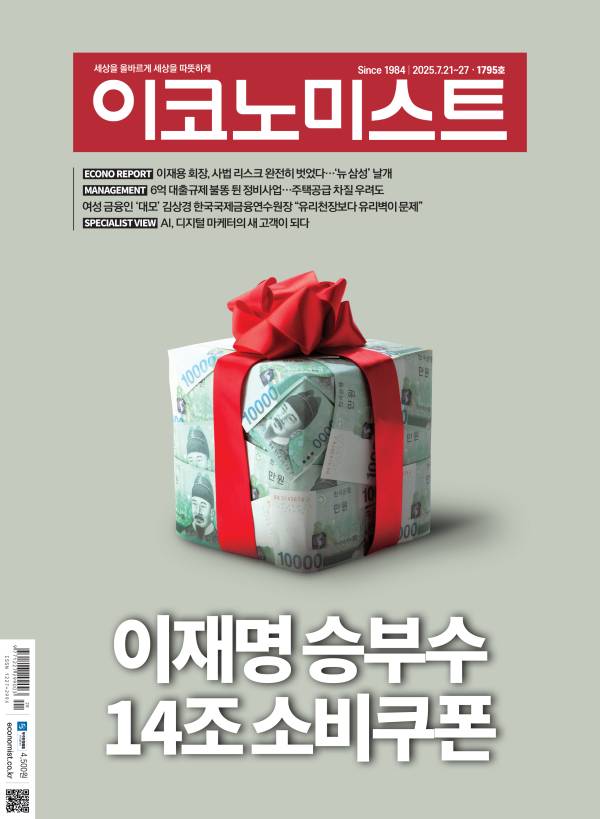
![마지막에 한방이 있다 ‘흑백리뷰’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06/isp20250706000027.400.0.jpg)
![장사+먹방+힐링..‘청춘만물트럭’은 낭만을 싣는다 [김지혜의 별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6/22/isp20250622000054.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이정후 타격감 미쳤다…또또 멀티 히트, 3안타 폭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하트시그널3’ 서민재, 전 남친 또 저격…무슨 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손님이 늘긴 늘었어요” vs “다 남의 일”…소비쿠폰 체감 ‘제각각’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슈퍼달러에 웃었던 국민연금, 올해 환율 효과는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최근 한달 6곳 예심청구...빗장 풀리는 바이오 IPO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